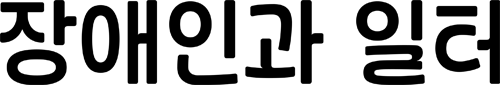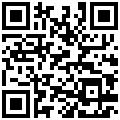장애인복지 10년 (2021-2030)
전략에 담긴 장애인 고용
-
- 글.
- 이정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센터장
베트남은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프랑스-베트남 독립전쟁, The First Indochina War, 1946-1954)에 이어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미국-베트남 전쟁1, 1965-1973)에서 연거푸 승리하며 냉전시대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국가로 위상을 떨쳤다. 하지만 두 번의 큰 전쟁은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장애인을 남겼다. 팔과 다리 절단, 실명, 신경 마비, 신체적 장애나 외상 후 스트레스, 우울증 등 심각한 정신적 장애, 고엽제 후유증으로 아직도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
책임지는 나라
전쟁의 상흔(傷痕)은 곧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상병(Invalids)이 되었고, 베트남은 치료에 온 힘을 다했다. 이를 맡아온 정부 부처인 노동보훈사회부(MLISA: Ministry of Labour, Invalids and Social Affairs2)의 명칭을 보면 베트남이 얼마나 국민을 치료하기 위해 진심을 보였는지 알 수 있다. 영문 부처명을 보면 ‘국가보훈대상자(Veterans)’가 들어갈 자리에 ‘상처 입은 사람(Invalids)’이라고 되어 있을 정도이다. 베트남은 전승국이라고는 하지만 장애를 입은 참전 용사들에게 해줄 것이 많지 않았다. 너무 가난했기 때문이다. 전통의 농업 생산성으로는 인민의 삶도 구원할 수 없었다. 빈곤으로 정권이 몰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은 1986년 이른바 ‘도이모이(Doi Moi)’ 경제 정책을 불러왔다. 변화와 새로움이라는 뜻을 가진 이 경제정책은 어느새 꽃을 피워 연평균 6~7%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는 중견국가가 되었다.

1 우리나라는 베트남 전쟁에 1965년부터 1973년까지 연 인원 35만 명, 매년 평균 4만 명 정도의 군인을 파병하여 참전하였다.
2 노동보훈사회부 영문 공식 명칭은 Ministry of Labour, Invalids and Social Affairs이며 베트남어로는 Bộ Lao
động - Thương binh và Xã hội이다. 2024년 12월 2일 대대적인 정부 개편으로 내무부와 통폐합되었다.
장애인을 위한 모든 것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오며 베트남은 드디어 2010년 6월 17일 장애인 법(Luật Người Khuyết Tật)을 제정하였다. 베트남 장애인 법은 베트남
장애인3을 위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장애인 고용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이다. 베트남
국가장애조정위원회(NCCD)는 베트남의 장애인 인구를 800만 명(2018년 기준), 즉 전체 인구 1억 명 중 7.8%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장애인 취업률은 약
30% 정도이고, 200만 명 정도의 장애인이 구직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베트남 통계청(GSO)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기업의 54.3% 이상은 장애인고용에
관심이 없고, 24.4%만 관심을 두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고용하겠다는 기업은 겨우 1.4%에 불과하다고 한다. 나머지 19.9%는 답변 자체를 거부했다.
의무고용제도는 도입하지 않았고 장애인고용은 사업체에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마냥 미온적이지는 않다. 장애인 법 제34조4는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체를 위한 지원 제도를 담고 있다. 먼저 도
및 중앙 직할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장애인 근로자를 30% 이상 고용하는 사업체에게 사회정책은행의 생산 및 사업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우대 대출, 대출 조건, 대출
기간, 대출 금액, 대출 이자율을 조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출도 해준다. 장애인 근로자를 70%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체에게는 생산 및 사업을 제공하는 토지,
부지 및 수면 임대가 완전 무상으로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근로자를 30% 이상, 70% 미만으로 고용하는 사업체는 시설의 생산 및 사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지, 건물 및 수면에 대한 임대료를 50% 감면해 주고 있다5. 2010년 장애인 법 시행은 참전 영웅의 상병 치료에
머물렀던 장애인 정책에 장애인고용 정책까지 담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폭을 더욱 넓히는 성과를 올렸다.
장애인 계획 10년
이후 더 나아가 베트남 정부는 2020년 8월 5일 ‘베트남 장애인 계획 10년(2021-2030)’을 발표한다. 본격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직업교육, 일자리 창출 및 생계지원
정책을 대대적으로 펼칠 전략을 수립한 것이다. 10년 계획의 마지막 2030년에는 장애인 30만 명에게 직업훈련 및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일하는 장애인에게는
우대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6, 2021-2025년에는 소득이 불안정한 장애인을 우선으로 직업훈련을 시키고 일자리를 알선한다는 것도 주요
골자이다. 또한 같은 시기 새로운 농촌지역에도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담아 장애인 관련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도 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베트남의 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농촌지역에서도 장애인고용을 확산시키려는 정부의 전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듯 ‘장애인 계획 10년’ 프로젝트는 도시, 농촌 따로 없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지역마다 장애인고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 중 하나로 2024년 세계 장애인의 날(12월 3일)을 맞아 하노이시 고용서비스 센터(DVVL)는 하노이 장애인 협회(PWD)와 함께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열었다. 이날 37개
사업체가 구인·구직 부스를 열었고 1,276명의 장애인이 현장에 참석했다. 행사를 통해 장애인고용 또는 직업훈련으로 이어진 장애인은 516명이라고 전해졌다. 하노이시만 해도 약
110,000명의 장애인이 살고 있고 이 중 7,700명 정도가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은 원하는 만큼 장애인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베트남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지점이다.
베트남의 장애인고용 노력은 우리나라와 무관하지 않다.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를 통해 광시성에 장애인종합재활센터 설립을 지원 중이다. 동남아 메콩강 인근 국가들이 경험한
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베트남 전쟁 피해 지역에서 장애인의 재활과 취업을 위해 우리나라가 장애인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베트남 꽝찌성(城)은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남쪽으로
600km 떨어져 있는 꽝찌성 동하시(市)는 과거 남베트남과 북베트남 사이의 비무장지대(DMZ) 아래에 자리 잡고 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다. 전쟁의
피해로 꽝찌성은 현재까지도 베트남에서 장애인 거주 비율이 가장 높다. 2021년 말 기준 2만 9,000여 명이 지체·청각·시각 장애 등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고, 이 중 16세
미만 장애 아동도 7,000여 명에 이른다. 전쟁 중에 살포된 고엽제가 몸에 축적돼 자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한다. 코이카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1200만
달러를 들여 이 지역에 연면적 4,800㎡, 4층 규모의 장애인 종합재활센터를 지을 예정이다. 지뢰· 불발탄·고엽제 피해 장애인들이 이곳에서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베트남 장애인고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가를 파견하여 전문인력양성교육을 실시하였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2024년 11월
27일~28일까지 이틀간 베트남 국가장애인위원회에 찾아가 ‘베트남 장애청년 경제자립 지원 강화 사업’이라는 주제로 정책 제언을 했다.
이제 베트남도 UNCRPD 권고를 벗어날 수 없는 중견국가가 되었다. 동남아시아 장애인복지, 장애인고용의 선두주자로 앞서고 있는 모습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50년 전 우리는
서로에게 총구를 겨눌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아시아 장애인고용을 위한 동맹국이 되었다. 이념도 민족도 다르지만 장애인을 위해서라면 지금의 인연을 끝까지 이어가길 바랄 뿐이다.



3 베트남의 장애인은 코뮌, 구, 읍 인민위원회가 발행한 장애 증명서로 입증한다.
4 2013년에 개정됐지만 법령 제9조에 따라 개정된 법인 소득세법 제2조 4항 k항 에 의해 폐지됨
5 토지, 부지, 수면 임대료 면제 또는 감면 기간 동안 생산 및 사업소는 토지, 부지, 수면 사용권을 전환, 양도, 기부, 증여 또는 임대할 수
없다고 정의한다.
6 장애인 법 결정번호 1190/QD-TTg(2022.1.18.)